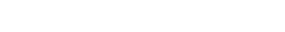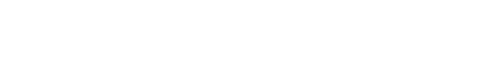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이병민, 영화 《나의 EX》의 젠더 수행성과 이데올로기, 2022. 1
- 작성자: admin(단국대)
- 작성일: 2022.03.01
- 조회수: 1524
논문제목 : 영화 《나의 EX》의 젠더 수행성과 이데올로기
저자 : 이병민(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등재지 : 중국문학연구 제86집
발행처 : 한국중문학회
주제어 : 젠더 정체성 ; 수행성 ; 이성애 규범 ; 동성애 ; 젠더 다양성 ; 섹슈얼리티 ; 모성 ; 가부장 ; 정화 ; 연대 ; 性別身份認同 ; 遂行性 ; 異性愛規範 ; 同性愛 ; 性別多樣性 ; 性興趣 ; 母性 ; 家長 ; 淨化 ; 連帶 ; Gender Identity ; Performativity ; Heterosexuality ; Homosexuality ; Gender diversity ; Sexuality ; Motherhood ; Patriarchy ; Catharsis ; Solidarity
<요약>
사회화된 젠더 역할은 다른 시대 문화에서도 혹은 한 시대 한 사회에서도, 고정되거나 일관되지 않다. 사람들의 젠더 정체성이 항상 사회 규범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핵심적인 것은, 젠더는 ‘수행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젠더의 내적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련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젠더화된 몸의 양식화를 통해 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젠더는 한 개인이 사회와의 교섭 속에서 자신의 몸과 내면에서 체화하며 반복하는 행동을 통해 표출되고, 그 천착의 과정 속에서 정해진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젠더는 변화 가능하다.
쏭쩡위안은 아제가 엄마에게 쏭쩡위안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하자,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거야.”라며 만류한다. 그야말로 훗날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부정하고 류싼롄과 결혼한 쏭쩡위안다운 대답이기도 하다. “가족을 힘들게 안 하고, 걱정 안 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니까.”라고 하면서 이성애 규범에 얽매여 있을 가족이 상처받을 것이라 여기고 미리 알아서 배려할 뿐이다. 쏭청시는 동성애 젠더에 대한 편견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엄마가 싫더라도 아제에게 와서 묵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쏭청시에게 중요한 건 정체성이 아니라 함께 안주할 수 있는 관계성이었고, 그의 이런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중립적인 입장은 그가 이 영화의 나레이터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아제는 배우들 출연료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료 배우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류싼롄이 찾아온 것을 역이용하여, 자신이 탈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겠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허세도 부리고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남자다움을 과시하는’(macho) 남성성을 지닌 사람이기도 하다.
류싼롄은 남편 쏭쩡위안과의 부부 사이의 문제가 순전히 섹슈얼리티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남편을 유혹하는 자태를 취하면서 멀어진 관계를 성급히 봉합하고자 한다. 즉 그는 서로 본질적인 정서적⋅심리적인 괴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여성으로서 재현된다. 사실 류싼롄은 중학생 아들을 둔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섹슈얼리티가 제거된 ‘모성’만을 지닌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아제와 배우들, 그리고 스텝들이 협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린 연극 공연은 그다지 세련되지 못하고 조잡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다(realistic). 아울러 이 장면을 포함한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아제의 어머니가 꽃을 가져온 시퀀스는, 이 연극이 모두의 갈등을 정화(catharsis)시키는 제의적(ritual) 성격을 지녔음을 일깨워준다. 아제가 지닌 아픔에 공감하며 그의 연극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하며 관객들은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화해하게 되고 연대와 상호 지지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