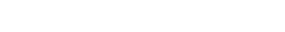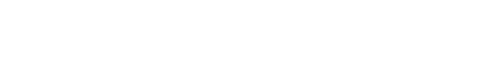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김경남, 국역 해행총재를 통해 본 지식 교류의 두 층위 , 2021.11
- 작성자: admin(단국대)
- 작성일: 2021.11.19
- 조회수: 4544
논문제목 : 국역 해행총재를 통해 본 지식 교류의 두 층위
저자 : 김경남(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등재지 : 지역과 역사 49호
발행처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제어 : the GUKYEOK(Korean translation) HAEHAENGCHONGJAE(國譯海行摠載) ; Knowledge Exchange ; Record of the Diplomatic Mission(使行記錄) ; Fatigue-drift Record(被虜·漂流記錄) ; Vitality ; 국역해행총재 ; 지식 교류 ; 사행 기록 ; 피로·표류 기록 ; 생동감.
<요약>
이 글은 『국역해행총재』를 대상으로 시대 상황에 따른 지식 교류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작품을 사행 기록과 피로·표류 기록으로 나누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지식 교류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교류의 두 층위가 갖는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해행총재』는 조선 후기 일본 사행 기록(일기)을 모아 엮은 책으로 조엄의 『해사일기』에 따르면 洪啓禧가 처음 편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徐命膺의 『식파록』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책은 그 실체를 알 수 없고, 또 『월봉해상록』이 간행될 당시 조엄이 쓴 ‘발문’에서는 그 당시 윤봉조가 일본 사행 기록을 모아 『해행총재』를 편찬했다고 하나 이 또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 이후 1914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해행총재』 4책을 간행하였으며, 1975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다수의 작품을 추가하여 이를 국역하였다. 이 점에서 『국역해행총재』는 조선시대 한일 지식 교류의 양상과 특징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지식 교류의 두 층위를 고려할 때 사행단과 피로·표류 기록은 공식성과 체험의 생동감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역해행총재』를 통해 볼 때, 근대 이전 일본과의 지식 교류에서 ‘사행단 기록’은 공식성을 띠며 그를 통한 서적 유입 등의 지식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피로·표류 기록’은 격식적인 면보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생동감이 잘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